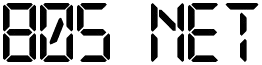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은 끝 모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전쟁터의 상징이었다. 20세기 초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과 달리 무기의 발달과 참전국의 확대로 인해 대량학살이 동반되었던 그 이전의 어느 전쟁보다도 참혹한 전쟁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부전선은 밀고 밀리는 와중에 무의미한 죽음이 난무하던 곳이었다. 후대의 어느 역사가에 따르면 이러한 참혹한 전쟁에 대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연합국이 나치 독일의…
[카테고리:] 드라마
가족의 탄생
요즘 연기 좀 한다하는 배우들이 다 모였다. 문소리, 고두심, 엄태웅, 공효진, 봉태규, 유승범 등등. 가족에 시달리고 가족에 목매인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형성하는 외로운 사람들에 관한 영화이다. 극은 마치 별로 개연성 없는 삼부작처럼 진행이 된다. 철없는 남동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누나, 철없는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딸, 그리고 너무 정이 많은 애인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자. 서로가 현재의…
로마, 무방비 도시(Roma, Città Aperta / Open City)
로베르토로셀리니의 1945년 작품인 이 영화는 마치 에릭홉스봄의 20세기 역사를 다룬 명저 ‘극단의 시대’를 영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파시즘과 나찌즘이 극에 달하던 시기 로마에서 저항운동을 펼치던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그린 이 영화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탈리아식의 사회주의 네오리얼리즘의 큰 축을 이룬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주의 : 이하 스포일러 있음> 극의 줄거리는 크게 반독 항쟁을 벌이고…
The Road to Guantanamo
관타나모로 가는 다소 복잡한 경로에 관해 서술한 영화이다. 관타나모는 쿠바 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1903년 이래 미국이 자국의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위 미국의 테러세력과의 전쟁 이후 불법적인 전쟁포로 수용소로 유명해진 지역이었다.관타나모 수용소 포로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불법감금, 폭력행사 등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는 그 곳이 자국의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각종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Terms of Endearment
태어나서 자라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다 죽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이 영화는 인간의 거의 예외 없는 이러한 삶을 엠마(데보라윙어)의 삶과 죽음을 통해 조명한다. 특별한 기교나 반전 없이 엠마와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변해가는 삶을 관찰하는 이 작품은 초반 엠마의 밝은 성격으로 말미암아 다소 가벼운 로맨틱코미디의 분위기로 흘러가다 어느 날 엠마가 우연히 병원에서 종양을…
Dogfight(샌프란시코에서의 하룻밤, 1991)
Dogfight(개싸움)은 비행기 공중전을 가리키는 속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탑건류의 전쟁액션물? 아니다. 이 영화에서 개싸움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가장 못생긴 파트너를 데려오는 이에게 판돈을 몰아주는 이색파티의 명칭이 그것이다. 내일이면 베트남이라는 전쟁터로 떠나는 에디 버들레스(리버 피닉스 분)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친구들과 함께 개싸움 파티를 위해 뿔뿔이 흩어져 추녀들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엮은…
Kes
가난한 노동계급 집안의 존재감 없는 소년의 자아극복에 관한 영화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상 조롱과 소외에 시달리는 빌리캐스퍼라는 소년이 황조롱이(kestrel) – 황새목 매과의 조류 –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조련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존재감을 회복한다는 단순한 스토리다. 하지만 감독 켄로치 Ken Loach 는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촬영기간의 이 저예산 영화에서 억지스러운 감정이입 없이 보잘것없는…
Gate of Flesh/ 肉體の門(1964, 日)
다무라다이지로(田村泰次郞)의 원작(1948년)을 바탕으로 스즈키세이준이 감독한 소프트코어 섹스영화. 감독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알사탕 사나이’ 시시도 조가 예외 없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악스러움을 무기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의 삶터에 찾아들며 성(性)을 통해 정신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이부키 역을 맡았다. 일본에서 특유하게 성장하였던 Pink Eiga(ピンク映画) –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던 소프트코어 섹스영화장르 – 라는 장르의 대표 격으로 사도-메조히스틱한 성묘사를 통해 성(性)정치학을…
Heavenly Creatures(1994)
우정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악랄하리만큼 변태적인 컬트 Bad Taste 의 감독에서 ‘반지의 전쟁’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피터잭슨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1994년작. 외골수 파울린이 생기발랄한 소녀 줄리엣(케이트윈슬렛)을 만나서 애정에 가까운 우정을 발전시켜나가는 와중에 둘은 줄리엣의 엄마가 자신들의 우정을 파괴하려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결과는 파국적 종말. Bad Taste, Dead Alive 의 악동 스타일 영화로 명성을…
Kids
여기 나오는 십대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개념없음>이다. 여자랑 자기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내고 하루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새 섹스상대를 바꿔대는 아이, 밥 먹듯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이, 기분 나쁘다며 다른 십대를 집단 구타하는 아이들, 마약을 하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는 떠들썩하게 파티를 하고는 아무데서나 잠을 청하는 아이들 등등. 친구를 따라나섰다가 뜻밖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