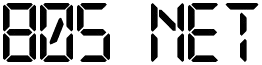By https://www.amazon.co.uk/Smiths/dp/B00002496V/ref=sr_1_1?ie=UTF8&s=music&qid=1273132134&sr=8-1, Fair use, Link The Smiths는 데뷔앨범 The Smiths의 녹음작업을 처음에 런던의 왜핑(Wapping) 지역에 위치한 엘레펀트스튜디오에서 시작했다. 당시의 프로듀서는 소속사 러프트레이드가 선택한, The Teardrop Explodes의 기타리스트였던 트로이 테이트(Troy Tate)였다. 밴드 멤버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프로듀싱을 맡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녹음은 뜻대로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낙후한 지역인 왜핑에 위치한 열악한…
[태그:] The Smiths
Michael Stipe와 Morrissey의 만남
By Kris Krug @ https://www.flickr.com/photos/kk – https://www.flickr.com/photos/kk/2332841534/, CC BY-SA 2.0, Link (R.E.M.의) 마이클 스타이프(Michael Stipe)가 캐롤린플레이스(Carolin Place)에 나타났고, 우리는 퀸세이 식당들의 똥 냄새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운데 뒷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이 동네가 싫어요.” 내가 마이클에게 말했다. “그럼 왜 여기 사세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처음 Everyday is like Sunday를 들었을 때 정말 부러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Talking Heads / Speaking in Tongues [1983]
By May be found at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discogs.com/viewimages?release=2188727, Fair use, Link 걸작 Remain In Light을 내놓은 뒤 Talking Heads는 한동안 꿀맛같은 휴지기를 가졌다. 이 시기에 데이빗번은 브라이언이노와 함께 1981년 My Life in the Bush of Ghosts라는 제목의 앨범을 내놓았다. 데이빗 개인적으로는 The Catherine Wheel이라는 앨범 작업도 했다. 우연히도 나머지 멤버들도 같은 해 자신들만의 창작물을…
Johnny Marr & Talking Heads
토킹헤즈가 그들의 새 앨범을 파리에서 나와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하였다. [중략] 그들은 우리 세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밴드였고, 예술적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밴드 중 하나라는 희귀한 업적을 이루었다. 난 그들의 음악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앨범에 기여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에 대해 기뻤고 흥분했다. [중략] 앨범을 프로듀싱한 스티브 릴리화이트(Steve Lillywhite)가 작업실에 있었는데, 내가 알던 이여서 반가웠다. [중략] 나는…
The Smiths / Hatful of Hollow [1984]
By The cover art can be obtained from Rough Trade., Fair use, Link The Smiths가 1984년 11월 2일에 Rough Trade Records를 통해 발매한 컴필레이션앨범이다. 앨범에는 밴드의 초기 활약을 잘 설명해주는 싱글들이 The Associates의 Billy Mackenzie를 겨냥한 노래라는 설이 있는 William, It Was Really Nothing에서부터 영화 프리티인핑크의 수록곡 Please, Please, Please, Let Me Get What I…
The Blue Nile / Hats [1989]
By The cover art can be obtained from Linn Records., Fair use, Link Hats는 스코틀랜드 밴드 The Blue Nile의 데뷔앨범 A Walk Across the Rooftops 이후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으로, 원래 1989년 10월 16일 Linn Records와 A&M Records를 통해 발매되었다. 이 앨범은 밴드 전체의 경력 중에서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밴드의 가장 성공적인 앨범이 되었다. 발매 당시…
The Smiths / Louder Than Bombs [1987]
By May be found at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mediawiki.org/wiki/Manual:External_editors, Fair use, Link Louder Than Bombs는 영국의 록 밴드 The Smiths의 컴필레이션 앨범1으로, 1987년 3월 미국 레코드 회사인 Sire Records에서 더블 앨범으로 발매되었다. 이 앨범은 미국 Billboard 200 앨범 차트에서 62위를 기록했다. 대중의 요구가 커지자 Rough Trade도 영국에서 앨범을 발매하였다. 1987년 5월 영국에서 발매되자 영국 차트에서…
Johnny Marr의 새 앨범 소식
현재 The Smiths의 재결합에 관한 최신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가라앉고 있다. Johnny Marr가 – 전문가적인 타이밍으로 – 그의 솔로 데뷔 앨범 The Messenger를 발표하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잡기로 결정했다. 1987년 The Smiths와 결별하면서 The The, Modest Mouse, The Cribs 와 함께 연주하면서( Electronic이나 Johnny Marr and the Healers와 같은 새로운 밴드들도 결성하면서) Marr는 그만의 새로운 것을…
500일의 썸머(500 Days of Summer)
‘500일의 썸머(500 Days of Summer)’. 썸머는 극중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말미에 가보면 알겠지만 또한 여름의 본래 뜻을 내포하여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은유하기도 한다. 수줍음 많이 타고 도전적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조용한 성격의 남자 탐은 한 카드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한다. 건축가가 꿈이지만 맘속에서만 품고 있을 뿐이며, 사장의 새 비서로 온 썸머가 마음에 들지만 쉽게 다가서지도 못하는 그런 남자다….
Here’s Johnny Marr
The Smiths had to break up because the pressure on me was intolerable. By the time of our third album, The Queen Is Dead, my drinking had spiralled out of control and it was making me seriously ill. Basically I was using alcohol to lessen the unbearable strain I was under.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