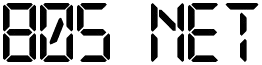얼마 전에 수잔 손택이라는, 이미 유명을 달리한 저명한 평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우디 알렌의 초기작인 가짜 다큐멘터리 Zelig에서 그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이지적인 외모와 목소리로 짐짓 진지하게 우디 알렌의 엉터리 캐릭터를 분석하는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그래서 회사 도서실에서 가장 유명한 그의 저서 ‘해석에 반대한다.’를 빌려 아침 일찍 출근할 때마다 틈나는 대로 읽고 있다. 이 에세이 모음집에는 Jack Smith 감독의 기괴한…
[태그:] 우디 알렌
최근에 본 영화들 단상
밀양홍상수의 영화 속 등장인물은 영화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이 현실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반면, 이창동의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영화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하지 않을 것 같은, 진짜 일상생활에서 할 것 같은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박하사탕’, ‘시’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공력이 이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줄거리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