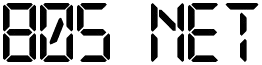무리한 방식이긴 하지만 몇가지 키워드를 제시해봄으로써 80년대 음악을 관찰해보기로 하죠. ★ MTV81년 개국된 이 음악전문방송을 떼놓고 80년대 음악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수들은 좋던 싫던 뮤직비데오를 제작해야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노래와 앨범의 상업적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데오스타를 비난했던 다이어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 조차 뮤직비데오를 제작해야했고 아이러니칼하게도 그 해에 가장 뛰어난 비데오클립으로 선정되기도 했죠.(뮤비의…
[카테고리:] 칼럼
레코드회사들이 저지른 뼈아픈 실수 1위는?
Blender.com 은 최근 “20 Biggest Record Company Screw-Ups of All Time”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레코드 회사가 저지른 가장 멍청한 실수 20가지를 선정했다. 흥미로운 실수 몇 개를 살펴보자. 17위에 에디슨이 세운 레코드 회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축음기의 발명가 에디슨이니만큼(사실 발명가라기보다는 사업가지만) 당연히 그는 National Phonograph Company(나중에 Edison Records 라고 개명)라는 이름의 레코드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음에…
펑크의 반항에서 테크노까지, 소비사회에 대항하는 문화운동
http://www.design.co.kr/D/d200005/html/118.htm ‘대항문화’라는 문구는 언뜻 모순되어 보인다. ‘대항’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뜻인데 문화적이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의미와 가치를 뽑아내고 그것을 해석하고 감상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항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성립하는가? 어떻게 개방적이고 창조적이며 의미 있는 문화적 실천행위가 전술적인 대항을 의미하는 용어와 나란히 쓰일 수 있는가? 아마도 19세기의 정치철학가 칼 마르크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을 것이다. 마르크스 및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Kids Incorporated에 관하여…
“Kidsinclogo” by Derived from a digital capture (scan). Licensed under Wikipedia. by Mikstipe 90년대의 틴 팝 스타들 –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 이 모두가 디즈니 채널 어린이 프로그램인 ‘미키마우스 클럽(Mickey Mouse Club)’ 출신이라면, 사실 80년대에는 이에 그리 뒤지지 않는 팝 스타 꿈나무들을 키웠던 어린이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 프로그램이 바로…
커버버전
http://en.wikipedia.org/wiki/Cover_version 어떤 노래의 커버버전은 다른 아티스트에 의해 다시 녹음되는 것을 말한다(리메이크와 ‘개선된 리메이크’와 비교하라). 비록 커버버전이 때로 아티스트적인 이유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슈퍼마켓의 바겐세일 통을 채우기 위해, 심지어는 음반가게에서 특화시켜 발매된다. 그래서 잘 모르는 소비자는 오리지날 레코딩과 쉽게 혼동한다. 특히 그 포장이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 그렇다. 그것은 오리지날 아티스트의 이름을 큰 활자로 쓰고…
거물가수가 말하는 신참음악가가 돈 버는 방법
최근 Wired.com 에서는 미국의 어느 고참 가수의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David Byrne 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영미권의 펑크, 뉴웨이브 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전설적인 펑크락 클럽 CBGB를 통해 데뷔한 이래 펑크/뉴웨이브의 전형이 되어버린 그룹 Talking Heads의 리더이자 프론트맨이었기 때문이다.(한국어 팬페이지 가기) 그런 그가 최근 몇 년…
80년대 초중반의 대중가요
“Cho Yong-pil from acrofan” by acrofan.com – http://www.acrofan.com/ko-kr/life/content/main.ksp?mode=view&cate=0203&wd=20130424&ucode=0802030301&page=1&keyfield=&keyword=.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http://my.netian.com/~uickusa/music/mj704.html 대중가요계의 제 3의 안정기와 수퍼스타 조용필 ⑴ 가요계의 천하통일, 조용필 70년대는 포크의 등장으로 기존 가요계의 주된 흐름인 트로트와 스탠다드와는 분리된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나가고, 70년대 후반 록이 거기에 또 하나의경향을 보태는 등 새로운 경향들이 어느 것 하나도 뚜렷한 주도성을…
눈여겨볼 80년대 중반 가요의 흐름
글. 김영대( toojazzy@nownuri.net ) 한가지 전제를 깔고 시작하자. 이 연재물은 ‘댄스 음악에도 음악성이 있음’과 같은 고귀한 목적이 없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댄스 뮤직은 그저 춤을 추기 위해 존재하는 enjoyable한 음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댄스 뮤직이 무언가. 어찌 보면 대중음악이라는 본질의 극한에 닿아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르일 것이다. 그저 들으면 되고 그저…
80년대의 음악, 들국화, 그리고 서태지…
http://www.fancyria.com/board/read.cgi?board=bipyong&y_number=191&nnew=2 * 상당히 과격한 주장이긴 한데 의미있기도 한것 같아 펍니다. * 먼저 여러 가지 화끈하게 씹어주고 싶은 현안들이 널려 있지만, 우선 대한민국 음악사를 왜곡하고 정신병자 정치하는 놈들 수준으로 타락시켜 놓으려는 서태지와 빠순이들의 수작을 확실하게 뭉게야 하겠다. <난 서태지 수하에서 맹목적으로 따라는 그 기집년들을 빠순이라 부른다.> 밝은미친세상님은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한국음악의 전성기를 1980년 직후의 조용필 시절과 90년의…
New Romantics 와 패션
1980년대의 뉴로맨티시즘은 무엇인가? 뉴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은 1980년대 초기 런던의 나이트클럽에서 제조된 사조이다. 펑크(Punk)의 반(反)패션의 무정부주의적인 어법과 달리 몸단장에 보다 관심을 가졌던 창조적인 군상들로 이루어진 이 그룹 내에서의 활동가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곤 했다. 뉴로맨틱스는 사실적인 혹은 공상적인 테마와 헐리우드의 화려함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외모를 꾸몄다. 현란하고, 칼라풀하고, 드라마틱한 외모를 위해 역사적 시기와 연관된 주름장식과 관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