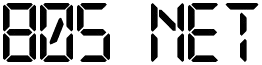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재능이 미술을 미술답게 하고 우리에게 예술적 쾌감을 안겨주는가? 이러한 질문은, 예를 들면 마르셀 뒤쌍의 작품 ‘샘(Fountain)’을 대할 때 더욱 대답하기 난감해진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던 것이 ‘샘’과 같은 현대의 추상예술에 접어들면 흐릿해지는 것이다. ‘피카소의 달콤한 복수’는 이런 현대미술의 모호함을 고발한 책이기도 하다. 한편…
[카테고리:] 칼럼
80년대 팝계의 20대 사건
By Jack Mitchell, CC BY-SA 4.0, Link 출처는 모릅니다 http://myhome.naver.com/ouimoi/favorite/80년대사건.htm 라는 링크가 남아 있긴 한데, 지금 열어보니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 페이지라는군요. 누군가 예전에 “음악세계”란 잡지에서 본 것 같다는 코멘트를 달아놓기도 했네요. 여하튼 저작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고요. 이 중 몇 개나 동의하시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Pop Events Of The Decade (80년대…
페르낭 레제, ‘여가 – 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
큐비즘, 기계, 건축, 공산당, 서민적 레크리에이션 등등. 우리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큐비즘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인 페르낭 레제(Jules Fernand Henre Léger)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나열해보았다.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작품 중 하나로는 ‘여가 – 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립 퐁피두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은 2008년 한국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80년대 팝 이야기 (프린스 작품선)
J. Hyun이라는 필명의 사용자분이 예전에 올려주셨던 팝칼럼을 다시 퍼올림. 오늘 프린스의 CD 3장짜리 히트곡집을 큰맘먹고 구입하려고 했더니 역시나… 동네 레코드점엔 프린스의 앨범이 한 장도 없더라구요. 제법 큰 레코드점이었는데도… 나온지 좀 지난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프린스가 우리 나라에서 그다지 지명도 높은 가수가 아니라는 점도 오프라인상에선 프린스 앨범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한몫 한 듯 싶습니다. 역시 우송료 무료인(가격이 가격이다보니…) 인터넷…
테마가 있는 80년대 팝 이야기 (비오는 날 듣는 음악)
추석기간 동안 팝아이가 예쁘게 새단장했네요. (stickey님이 공을 많이 들이신 듯… 대화방도 생기구요…^^) 개인 칼럼란이라니 무지하게 쑥스럽습니다. (사실 별로 쑥스럽진 않고, 그냥 예의상의 멘트…) 오늘 www.yahoo.com에 들어가니까 ‘Typhoon Maemi Hits South Korea, at Least 74 Dead’ 이런 기사가 첫창에 뜨는군요. 매미의 위력이 예상보다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매년 태풍으로 진통을 앓더니 어째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나 했지…) 엄청난 태풍을 예고라도 하듯이…
테마가 있는 80년대 팝 이야기 (허스키 보이스)
예전에 80snet.com이 popi.com이란 이름으로 제로보드 형식으로 운영되던 시절, J. Hyun님이라는 걸출한 글쟁이가 “테마가 있는 80년대 팝 이야기”란 이름으로 칼럼을 남겨주시곤 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게시판이 삭제되는 바람에 다시 복구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이 사이트가 블로그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몇몇 글이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몇 개 살아남은 글들은 옮겨 놓았습니다만 아직 옮겨 놓지 않은 글이 있어 반가운 맘에…
Duran Duran 블로그에 올라온 Roxy Music DVD 리뷰
One of the most influential bands of all time, Roxy Music gets a well-deserved and expertly produced career retrospective in this new DVD. Originally broadcast by the BBC in late 2008, the documentary covers the entire active recording career of the band as well as their recent reunions. The DVD expands on the original broadcast…
09.29.09: Seattle — 성난 이의 아침식사
여기 시애틀에서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내게는 선전선동으로 보이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입에 거품을 물거나 내 요거트를 호텔 다이닝룸에 뿌리는 등 격노하지는 않았다. 그에 대해 다시 오늘자 뉴욕타임스 1면의 사진을 보면 이란의 핵시설이라고 소문이 난 어떤 종류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그러한 것들의 그래픽 스타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이라크 침공 전에 범람했던 다양한…
박재범 단상
박재범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활동하는 재외교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재미교포다. 재외교포 출신의 연예인 중 1세대라 할 수 있는 이현우에서부터, 박정운, 유승준, 지누션, 다니엘 헤니 등 허다한 교포 연예인들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이들이다. 몇몇 소수의 예외라면 남미음악을 선보였던 임병수나 필리핀 국민가수로 2NE1에 합류한 산다라박 정도다. 이는 당연한 이치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그렇듯…
카셋테잎(cassette tape)
By Thegreenj – Own work, CC BY-SA 3.0, Link 얼마 전에 영국의 13세 소년이 소니 워크맨을 다룰 줄 몰라 쩔쩔 맸다는 기사가 올라 나이든 음악 팬들을 웃게 만든 적이 있다. 80~90년대 소년이었던 이들이라면 대부분 머스트해브 리스트에 올랐던 워크맨이 – 특히 소니 – 이제는 추억의 전자기기가 되어 13세 소년에게 굴욕을 당하는 그 기사에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