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Athyarchieve – Own work, CC BY-SA 4.0, Link
2007년 8월호 모조 매거진의 부록으로 제공되었던 소책자 80 From The Eighties의 발문을 조니 마가 작성하였다.
80 From The Eighties
Interviewed by Lois Wilson
[발문]
80년대가 시작하던 그때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열일곱이었고 맨체스터 도심부의 옷가게에서 일하며 존슨즈에서 팔법한 런던 킹스로드 로커빌리 스타일의 옷을 팔고 있었죠. 그리고 함께 밴드를 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클럽 씬은 정신 없었어요: 히어로즈라는 게이 클럽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시엔다가 있었죠.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명백히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려진 대로의 하시엔다 – 웃통을 벗고 손을 흔들어 대던 사람들의 – 는 좀 더 나중의 모습으로, 1987년에서 88년 정도일 겁니다. 1981년에서 82년의 그곳은 예닐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신인 밴드들의 공연을 볼 수 있던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80년대 밴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곤해요. 건 클럽, 버스데이 파티, 서튼 레이쇼, 씨어터 오브 헤이츠, 킬링 조크를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소위 포스트 펑크라 알려진 것들이죠. 포스트 펑크는 새로운 음악의 어휘집에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단어였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펑크 록은 오래된 음악의 어휘집에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단어였죠, 그것은 갓 등장한 펍 록이었어요. 그 뒤에 찾아온 것은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생기 넘치며, 간결한 미학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초기 기타 사운드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콜린 뉴먼과 에드윈 콜린스의 기타 소리도 마찬가지 구요.
존 필과 그의 프로듀서 존 워터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필의 라디오 쇼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게시판과 같았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이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던디의 음악가와 브라이튼의 학생이 만나거나 같은 시간에 음악을 들을 수 있었죠. 온 나라가 이 괴팍하고 열정적이며 전복적이고 힘을 가졌으나 타협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인물에 의해 결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밴드 자신들에게는 필의 라디오 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표출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주 받아 마땅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 토니 해들리 패거리나 사이먼 르 본 패거리들 말입니다. 금요일 밤의 TV를 장악하던 레벨 42, 리빙 인 어 박스, 튜브에 등장한 티어스 포 피어스도요. 정치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일반인들의 통제영역을 벗어났다는 압도적인 감각이 존재했습니다. 광부들의 파업은 마가릿 대처의 폭압적 권력표출과 토리당이 60년대부터 내세우던 모든 가치들이 낳은 결과입니다. 연대는 미디어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미세스 대처는 광부들에게 경제적 전략을 약속하지 않았고 동정 없는 잔혹함으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도덕성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거대한 무력감만이 있었습니다.
1986년 이후, 만약 인디 씬이 극심한 빈사상태에 이르러있었다면, 음반은 물을 줘서 만들었을 것이고 꽃은 스피커로부터 피어났겠죠.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고, 댄스음악은 그래픽 디자인, 기술적 측면, 약물, 의상, 포괄적 감각에 있어서 또 다른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들, 스미스는 주류로부터 추방당했다고 생각하며 적을 둘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반대로 엑스터시 친화적인 밴드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80년대가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확답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도 있겠지요…
조니가 가장 좋아하는 80년대 싱글 곡
1. The Beat Save It For Later [Go-Feet, 1980]
2. Talking Heads Burning Down The House [Sire, 1983]
3. The The Heartland [Epic/Some Bizare, 1986]
4. S’Express Mantra For A State Of Mind [Rhythm Hing, 1989]
5. Psychedelic Furs Dumb Waiters [CBS, 1981]
[Afterword]
The beginning of the 80s was a very exciting time. I was 17, working in a clothes shop in Manchester’s city centre, selling a take on the London King’s Road rockabilly style, the kind of clothes sold in Johnson’s, and I was looking for people to form a group with. The club Scene was busy: there was a gay club calld Heroes, which was seminal , then the Hacienda. That became a really key place, obviously, but what it’s known for – people with no shirts on with their hand in the air – came later, in 1987-88. In 1981-82 it was a great place to see the bands of the day with just seven other people. People forget that there were really good ’80s bands. I saw The Gun Club there, The Birthday Party, A Certain Ratio, Theatre Of Hate, Killing Joke. What’s now known as post punk, it was the letter A in the new lexicon. To me, and a lot of people of my generation, punk rock was the letter Z in the old lexicon, just warmed-up pub rock. What came afterwards was a reductive, clean, fresh, lean new aesthetic and that pretty much describes my early guitar sound and the guitar sound of Colin Newman and Edwyn Collins.
John Peel and his producer John Walters were very important. Peel’s radio show was like a bulletin for ideas for like-minded people. Because this was pre-internet it was a centralised hot spot, so a Dundee musicain and a Brighton student would be tuning in and listening at the same time. The whole nation was being brought together by this quirky, passionate, subversive character who was in a position of power but was bold enough not to compromise. And for bands themselves it was vital; it allowed us to formalise new ideas and get them out there.
But there was much to rail against, too – the Tony Hadleys and Simon Le Bons. Level 42, Living In A Box, Tear For Fears on The Tube, dominating Friday night TV. Politically there was a prevailing sense of things getting beyond the control of ordinary people. The miners’ strike summed up the crushing power of Margaret Thatcher and everything the Tories had stood since the ’60s. Solidarity was destroy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media. Mrs Thatcher wasn’t just implementing an economic strategy on the miners, but enforcing it with an absolute brutal lack of compassion. There was a terrible lack of innocence involved, and that created a massive sense of helplessness.
After 1986, if the indie scene had got any feyer the records would have been made out of liquid and petals would have flown out of the speakers. Things needed to change and dance informed a different mentality in graphic design, technology, drugs, clothes, sense of inclusion. The Smiths, we were looking for a home, feeling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and the bands who were chomping E, they were the opposite, they embraced and were embraced by everyone.
And did the ’80s make me a millionaire? Probably, but someone else got their fingers on it…
Johnny’s Fave ’80s Singles
1. The Beat Save It For Later [Go-Feet, 1980]
2. Talking Heads Burning Down The House [Sire, 1983]
3. The The Heartland [Epic/Some Bizare, 1986]
4. S’Express Mantra For A State Of Mind [Rhythm Hing, 1989]
5. Psychedelic Furs Dumb Waiters [CBS,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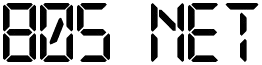
“토니 해들리 패거리나 사이먼 르 본 패거리” 윽 저는 이 패거리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조니마의 베스트 싱글 5는 저와 몇곡 겹치기도.. 다행 ^^
듀란듀란은 오디너리 월드랑 뷰투어킬을 들어봤습니다. 오디너리 월드 되게 좋았어요. 낭만적인 분위기.. 뷰투어킬은 정작 영화는 못 보고 뮤비만 봤네요. 로저 무어가 제가 젤 안 좋아하는 공칠이라 그래도 워켄 옹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보긴 해야겠는데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고보니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펫숍보이즈가 리빙데이라이트의 주제곡을 맡을 뻔 했던거요. This Must Be The Place I Waited Years To Leave를 들어보면 주제곡이 아하한테 넘어간게 다행인 거 같아요. 조니마가 기타까지 쳐줘서 정말 멋진 트랙이 되었습니다.
스팬도 발레는 퍼레이드 앨범만 들어봤는데 온리 웬 유 리브가 좋았어요. LP로 샀는데 턴테이블이 고장나서 버리는 바람에 이젠 돌리지도 못하고;; 근데 보컬님 초큼 느끼하시다능=ㅂ= 온리 웬 유 리브 뮤비를 봤는데여 20대 총각이 무슨 그런 중후한 오라를 뿜어냅니까 아아ㅠㅠ
조니는 스스로의 취향에 대해선 정말 완고한 것 같죠? 은근 까칠하세요. 저도 조니의 리스트 중에 좋아하는 곡이 몇곡 있긴 합니다. 베스트까진 아니지만^^;;
댓글이 넘 길어졌네요;;
그 말씀은 듀란듀란 곡중 두 곡만 들어보셨다는? @_@ 저는 듀란듀란을 통해 뉴웨이브에 입문(?)한지라 웬만한 싱글 B면곡도 다 아는 처지죠. ^^; 펩숍보이스가 007 주제곡을 불렀어도 멋있었겠네요. 왠지 게이스러운 시리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
듀란듀란은 어째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게 듀란듀란은 일종의 미지의 영역입니다^^;
jager님 통상적인 80s kid와는 약간 – 많이? – 다른 길을 걸어오셨군요 🙂 뭐 어쨌든 앞으로 또 그들의 음악을 미지의 음악으로써 접할 기회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ㅎㅎㅎ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들의 싱글 베스트5(무순)를 뽑아볼까요?
Friends of Mine, Skin Trade, Hungry Like the Wolf, I don’t want Your Love, Union of The Snake
근데 전 제가 80 kid인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어요. 80년대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80년대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안타깝게도 90년입니다ㅜ_ㅜ 이런 건 후천적 80s kid일까요?;;
듀란듀란 베스트5 목록은 훗날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