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re-cover” by Album cover artwork (c) Virgin Records (UK) 1981. Licensed under Wikipedia.
80년대 개막과 함께 동시에 들어선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보수정권시대의 팝음악은 70년대 음악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때는 커피든 오디오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전자산업의 만능시대였으며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시되는 시대였다. 이른바 일렉트로닉 전성기였고 비디오 시대였다. 대중음악도 따라서 외적 형태 (일렉트로닉)나 가수의 외모가 노랫말과 음악성보다 우선시되었다. 80년대 초반 전자음악(electronic music)의 유행을 몰고온 것은 영국 그룹들이었다. 거기에 바로 전세대의 펑크(뉴웨이브까지 포함)가 갖는 분노의 메시지는 자취를 감추었고 핑크빛 낭만의 소리로 질퍽했다. 그것이 대처리즘의 보수적 사회분위기에 휩쓸린 당시 영국 청년들의 대체적인 정서였다. 이무렵 뉴로맨틱 운동의 선두주자들은 듀란듀란(Duran Duran), 스팬도 발레(Spandau Ballet), 소프트 셀(Soft Cell), 디페쉬 모드(Depeche Mode) 등이었고 데이비드 보위도 잠시 후 그 물결에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 정복에 가장 먼저 성공하여 뉴로맨틱 팝의 길을 닦은 주인공은 휴먼리그(Human League)라는 그룹이었다.
필 오우키(Phill Oakey)가 이근 6인조 영국 셰필드 출신의 이 그룹은 일렉트로닉팝 시대의 본질적 특성을 함축했다. 우선 그들은 재래식 악기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룹엔 드러머, 베이스주자, 기타리스트가 없었고 가수를 빼고는 신디사이저 연주자들뿐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전통적인 키보드 신디사이저 대신 롤랜드 마이크로 콤포저 시퀀서를 앉혀 드럼 연주를 컴퓨터로 찍어 만들어냈다 드럼비트가 칼로 잰듯 정확하게 맞아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컴퓨터 음악’이 드디어 선을 보이게 된 것이었다. 필립 오우키는 82년 “뮤지션”지에 “우린 아마추어들이지만 개의치 않는다. 드러머를 고용하지 않고도 리듬을 만들어낼 기술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자신들 스스로 프로음악인이 아니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은 82년 미국 데뷔앨범 <<데어>>(Dare)로 “비틀즈처럼 넘버원 레코드를 갖고 싶어했던”꿈을 실현했다. “롤링스톤”지는 89년 “<<데어>>는 80년대 수준에서 록을 침투하고 있던 일렉트로닉의 공습을 위한 길을 깔아놓았다”고 정리했다. 싱글 <나를 원치 않나요>(Don’t you want me)는 가분히 전미 싱글차트 정상을 점령. 미국시장이 적극적으로 신시사이저 팝을 수용하려들고 있음을 반증했다.
얼핏 신디사이저하면 떠오르는 몰인간성과 차가움을 극복하고, ‘멜로디와 리듬만 좋다면 신디사이저도 통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미국 청취자들은 당시 <나를 원치않나요>를 들으면서 컨투리 음악으로 착각할 만큼 정겨움을 느꼈다. 사실 그들의 지향점도 ‘팝화된 신디사이저 사운드의 완성’이었다. 휴먼리그는 77년 결성되어 일렉트릭 사운드의 선구자 크라프트베르크의 뒤를 쫓았으나, 80년대 들어 거기에 팝적 색채를 덧칠하게 되었다. <<데어>>앨범의 프로듀서인 마틴 러센트(Martin Rushent)는 “나는 크라프트베르크가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수 있는 것, 이른바 팝적인 일렉트로닉 앨범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것은 휴먼리그가 자신들을 섹스 피스톨즈와 연계시켰다는 점, 그들은 섹스 피스톨즈가 그랬듯이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로큰롤 과정을 두고 보더라도 음악인으로서의 자질보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휴먼리그의 이같은 자세는 자신들의 대중적 사운드에는 걸맞지 않았지만 뜻밖의 진지한 입장 개진이었기에 눈길을 끌었다. 그런 만큼, 노래도 의식의 무풍지대가 아닌 날카로운 사회적 시각이 도사리고 있었다. <초>(Seconds)는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관한 노래였고 <군중의 소리>(Sound of crowd)는 병든 사회가 빚어낸 편집증을 다루었다. <하느냐 죽느냐>(Do or die) 또한 침묵의 종식에 대한 요구였으며 만만하게 인식된 <나를 원하지 않나요>도 실은 망각풍조가 팽배된 현실에 대한 일침이었다.
“내가 널 만났을 때 넌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지. 내가 널 데려와 가꾸어 돌려놓았지. 그래서 새사람을 만든거야. 5년이 지난 지금 넌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성공이 네겐 너무 용이했지. 그러나 이렇게 서게해준 사람이 나라는 걸 잊지마. 난 너를 옛날로 되돌릴 수 있어.”
<나를 원하지 않나요> 평범하지 않은 직설적 표현은 그들을 단연 뉴로맨틱 운동그룹진영 가운데 돋보이도록 해 주었다. 휴먼 리그는 음악하는 입장과 노랫말로 자신들이 백퍼센트 대중성 지향그룹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디사이저 만능주의’와 ‘컴퓨터음악 시도’는 음악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관련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그것은 음악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음악의 전부여서는 곤란했다. 이 점에서 그들에겐 결코 롱런할 수 없는 그룹이라는 숙명이 드리워져 있는 셈이었다. 그들의 본질은 당연히 많은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신디사이저와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휴먼’, 즉 인간이라고 그룹명을 내건 점부터 비위가 거슬린 사람들을 위시하여 표출된 반발이었다.(임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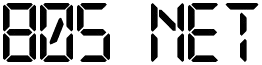
On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