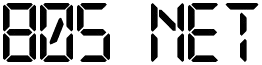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재능이 미술을 미술답게 하고 우리에게 예술적 쾌감을 안겨주는가? 이러한 질문은, 예를 들면 마르셀 뒤쌍의 작품 ‘샘(Fountain)’을 대할 때 더욱 대답하기 난감해진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던 것이 ‘샘’과 같은 현대의 추상예술에 접어들면 흐릿해지는 것이다. ‘피카소의 달콤한 복수’는 이런 현대미술의 모호함을 고발한 책이기도 하다. 한편…